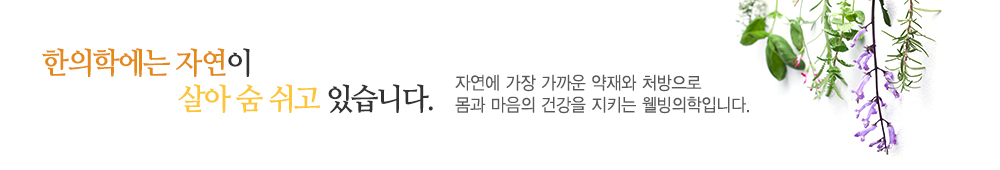서슬 푸른 날 당신은 온화한 미소로 텔레비전을 채웠습니다. 엄마 잃은 내색도 않고 대통령 아빠 옆에 있을 때, 당신은 웃고 있었지요. 아빠를 잃고도 우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웃음 뒤 언뜻 보이는 야릇한 눈매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대학 선배였지만 잊혀진 얼굴이었기에 생각 한번 못했습니다. 더구나 당신의 의붓오빠가 내 머리에 가득 차 있었기에, 당신은 안중에도 없었지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당신이 나의 마음에 다시 돌아올 줄을.
첫 여성 대통령이 되고자 나섰을 때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무슨, 독재자의 딸인데, 얼마나 치를 떨었는데’라며 지레 짐작하고 재껴두었습니다. 대선 토론에서 어벙벙하고 알맹이 없는 말들을 내뱉었을 때라도 당신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신이 읽어준 공약으로 조금은 꿈을 꿀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행위를 보면서도 당신을 사랑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사무친 원한을 풀어내듯 통합진보당을 없애버릴 때도,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겠다고 어거지를 부릴 때도, 위안부문제를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일본과 합의를 자행할 때도,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감행할 때도, 백남기 어른이 가셨을 때도 당신을 사랑할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잠깐 당신을 사랑하려 할 때도 있었지요. 지지난해 4월 16일. 304명의 아리따운 생명이 몰살당하는 순간을 눈 버젓이 뜨고 지켜볼 때, 당신을 정말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3년은커녕 1년도 못되어 사소한 말다툼과 잔잔한 웃음, 시시콜콜한 일상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 |
 |
|
| |
뒤늦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제 당신을 사랑하려 합니다.
도종환 시인은 “아이들과 함께 꽃씨를 거두며 사랑한다는 일은 책임지는 일임을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일은 기쁨과 고통, 아름다움과 시듦, 화해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삶과 죽음까지를 책임지는 일이어야 함을 압니다.”라고 노래하였지요.
“시드는 꽃밭 그늘에서 아이들과 함께 꽃씨를 거두어 주먹에 쥐며 이제 기나긴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끝나지 않았고 삶에서 죽음까지를 책임지는 것이 남아 있는 우리들의 사랑임을 압니다”라고 다짐하였지요.
당신의 죽음까지를 책임지는 사랑을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 책임은 당신의 뒤에 숨어 당신을 조종하는 삼성이라는 저승사자와 맞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뒤에 숨어 당신을 조종했지만 쓸모없다며 이제 내팽개치는 조선일보라는 구미호와 맞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책임지는 사랑은 당신이 자유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임을, 구중궁궐 골방에서 해방시키는 것임을 압니다. 이제 당신의 고통, 시듦, 쓸쓸함, 죽음까지를 책임지기 위해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리따운 304명의 생명을 보내고 남아 있는 우리들의 사랑이어야 함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