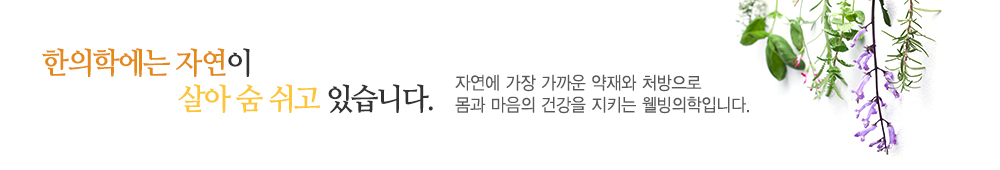하늘이 열렸다는 개천절. 다시 하늘이 새롭게 열리기를 빌며 하얀 저고리를 입고, 고 백남기 어르신의 분향소에 간다.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했던 쌀값 인상을 요구하며, 헌법에 자유롭게 하라는 시위를 했다. 멀쩡하게 걸어가던 고인은 이름도 살인적인 ‘물대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직접 분사 금지’라는 경찰 내부지침마저 어긴 살인적 진압이었다. 경찰의 안전을 고려한 수비가 아니었다. 시위대의 진출을 정지시키는 방어가 아니었다. 사람을 정조준하여 쓰러뜨리고, 쓰러진 후에도 쏘아댄 무서운 대포 공격이었다.
이미 그때 생명은 끝났던 것인지도 모른다. 육체는 숨을 쉬었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스러졌다. 의대생과 의사의 거미줄 같은 깨달음을 남기고 그는 317일 만에 저세상으로 갔다.
나와 상관없는 생명은 없다
분향소는 더웠다. 태풍이 밀고 오는 축축하고 뜨거운 공기가 분향소 안을 덥혔고, 바람마저 통하지 않았다. 공휴일 오후의 느린 발걸음들이 스쳐 지나간다. 횡단보도를 건너며 슬쩍 눈길을 주는 사람, 부리나케 옆을 지나쳐 가는 사람, 신호등을 기다리며 의아한 눈길을 보내는 사람.
돌연히 구급차 사이렌이 요란하다. 좌회전하는 차들은 계속 옆으로 돌며 달린다. 구급차는 그 사이사이를 돌아 아슬아슬하게 비켜 간다. 다급한 사이렌 소리는 이내 멀어진다.
한 생명이 위태롭다. 하지만 그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차들은 구급차가 지나가든, 사이렌 소리가 울리든 자기 차선의 파란 신호만 믿고 계속 달린다.
한 생명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생명과 아무 상관 없는 듯 사람들은 스쳐 간다. 자신의 파란 신호만 믿고 앞만 보며 달린다.
파괴 아닌 성찰적 분노를
강남순 교수는 “분노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자상하게 설명했다. 전근대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차별과 배제, 불공평과 조작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다. 노골적이지 않고 은밀하고 간접적이다. 그래서 ‘무엇에’ ‘왜’ 분노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본능적인 분노,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라 성찰적 분노가 필요하다. 성찰적 분노는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의가 집행되는 이득이 있다.
전체주의에 저항한 그람시는 세계에 무관심한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기생하는 것’이라며, 무관심은 ‘병’이라 했다. 나는 전염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