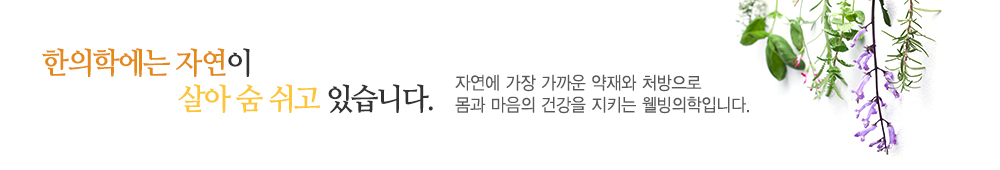오늘은 어딜 걸을까?
흑두루미가 자리를 잡을 동안만이라도 순천만에서 멀어지자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무심코 순천만에서 자전거를 탔던 자기의 무심함을 자책한 김 선생님 때문에라도 순천을 벗어났습니다. 생태수도인 순천의 행정력이 아직은 미약한가 봅니다. 순천의 새인 흑두루미가 안착할 시간만이라도 순천만 앞뜰에 사람이나 자전거,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내하였으면 좋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러저러하니 출입을 삼가달라며 김학수 기자의 멋진 흑두루미 사진을 보여드리면 모두 감탄할 것입니다. 사진도 멋지지만, 순천은 생태를 생각하는 멋진 동네구나 하고 말이지요. 아예 조례로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사람은 내가 꼭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도, 보살펴야 하는 그 무엇을 보면 애처로워하고 아끼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마음, 측은지심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법과 제도가, 도덕과 관습이 될 수 있고 또, 작은 안내문 한 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꼭 그 갈대길을 걸어야겠다는 계획은 안내문 하나에 감화되어 보지 않은 흑두루미를 마음에 담고 뒤돌아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순천만을 뒤로하고 여자만으로 향하였습니다.
비 온 새벽 장척마을은 고요합니다. 바다에서 뽈록 솟아오르는 물고기들과 쏘로록 빠져나가는 썰물 소리뿐입니다. 바다와 하늘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흐린 경계에 서너 척의 고깃배가 불을 반짝입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에선 치열한 삶이 있겠지요. 멀리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지요. 더구나 경계의 삶, 가장자리의 생활은 짐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200일입니다. 그 이후 가족들의 삶은 이승과 저승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인의 삶 자체입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맹골수도에 있기도 하고, 팽목항이나 광화문, 국회 앞, 청와대 앞에 있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을듯하다고 어슴푸레 짐작합니다. 마음 하나하나에 여자만 새벽 바다의 평온을 촉촉이 적셔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