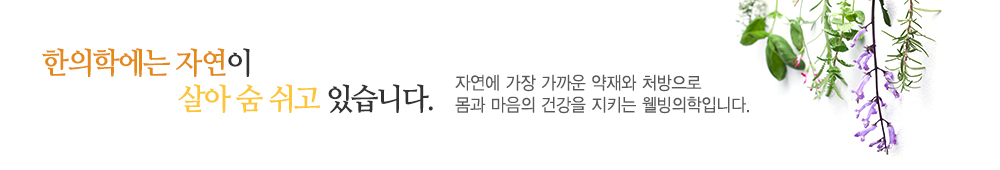|
집을 나서니 아파트 화단에 매화가 피었다. 전지한 후 앙상한 가지를 애닯게 보았는데, 매화가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듯하다. 겨우내 꽃잎을 빼꼼 내놓고 추위에 맞섰던 동백은 해룡천 악취에도 의연했다. 동성공원에 서 있는 산수유나무에는 나 보란 듯 노란 꽃이 수줍게 피었다. 차가운 기운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바람이 한결 부드럽다.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 첫 환자다. 돌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불편하게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말이 떨어지자마자 왜 이렇게 안 낫냐며 짜증 섞인 항의다.
왜 이렇게 낫지 않느냐는 짜증
엉? 시작이 반인데! 월요일 아침 첫 환자인데 이럴 수가!
진료기록을 보니 저번 달에 2번, 1주 전에 한 번 치료를 받았다. 왜 오늘에야 오셨냐 하니,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기다렸단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더 아파지더란다. 다른 때에는 기다리면 나았는데 왜 이번에는 더 아프냐고 푸념을 계속한다.
제대로 치료받지도 않고 왠 짜증?
아~!
나는 아직도 많은 수양이 필요하다. 그 환자의 항의는 못 낫게 하는 나에게가 아니라, 낫지 않는 자기 몸을 향한 것이다. 그런데 난 나를 뭐라 하는 줄 알고 되받아쳤으니... 이런 짜증은 투정이다. 좋으면서도 괜히 더 잘해달라고 앙칼지게 몰아치는 투정이다.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는 떼씀이요, 애인이 더 사랑해달라는 아양이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다시 나를 보러 여기에 와 있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 와서 나에게 짜증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한다. 어디 치료받을 곳이 여기 한 곳뿐이더냐!
짜증을 대하는 두 가지 방법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두 가지다. 내가 하라던 대로 안 해놓고 왠 소란이냐고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첫째요, “아, 그래요. 어디 한 번 봅시다.”라며 아픈 곳을 지그시 눌러보는 것이 둘째다. 첫째만 하는 의사도 없고, 둘째만 하는 의사도 없다. 사람 따라 또, 시간 따라 다른 대응을 하고 나의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엄 청나게 착하고 조심스럽게 응석을 부려도 내 기분이나 수준이 엉망일 때는 사무적인 댓구가 뒤따른다. 반대로 괄괄하고 투박한 투정도 내 기분이 부드러운 솜사탕이라면 모두 흡수해 받아넘긴다. 나의 수양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쌓여갈수록 넓어지는 법이다. 모래를 쌓아보자. 높이 올리려 계속 쌓으면 꼭대기도 올라가지만, 꼭대기에 쌓이는 모래보다 옆으로 흘러 땅을 덮는 모래가 많아진다. 마음의 결이 쌓이면 쌓일수록 수용하는 감정의 결뿐만 아니라 폭도 넓어진다. 그럴수록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평화롭다. 세계에도 평화가 있어야 하듯 나에게도 평화가 깃들어야 한다. 그런데 안팎에서 벌어지는 이놈의 전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