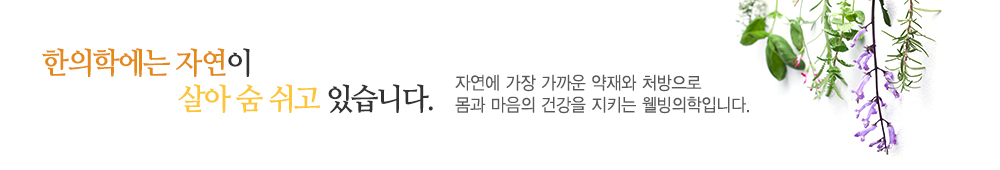|
매번 몸이 무거울 때면 아버지 생각이 난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사람 좋아하고 술 즐겨하신 뚱보 아저씨다. 마흔 넷에 위암 판정을 받고 3년간 투병생활을 했다. 대학 신입생 시절 여름 방학 내내 아버지 곁에서 간호했다. 뚱보 아저씨가 홀쭉이 아저씨가 되었고, 더운 날에도 이불을 덮어 달라 하고, 좋아하던 음식을 넘기기 힘들어 하며, 화장실에 가실 때는 다리가 휘청거렸다. 어머니가 돌보는 것보다 나를 더 편해 하셨다.
개학 준비에 서울로 올라간 사나흘 후, 그날따라 불안한 마음에 잠이 쉬이 들지 않았다. 언제 잤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눈 떠보니 빨리 내려가 보란다. 백모님 말씀에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기다리던 아버지 친구 분 차를 타니 마음이 느슨해졌다. 아버지는 말씀도 못하시고 눈도 반쯤 감긴 상태였다. 아버지를 불러보라는 말에 깡마른 손을 잡았다. 온기는 있었지만 한 번도 힘을 주지 못하고 아버지는 조용히 가셨다. 3일장을 치루고 새벽이 되었다. 10여 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의 공간이었던 콘크리트 슬래브 단층집. 그 집을 떠나는 아버지가 서러웠다. 왠지 모르게 눈물 없던 나는 흐느꼈다. 최루탄이 턱 밑에서 터졌을 때도 그 때만큼 눈물이 많이 흐르진 않았다.
할아버지는 3대 독자셨다. 할머니가 3남 1녀를 두셨다. 결혼시키자마자 폐병으로 장남을 잃으셨다. 차남의 정말 잘 생긴 장손은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백혈병으로 죽었다. 삼남인 아버지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자 여한 없이 돌아가셨다. 어쩐 일인지 하나남은 사촌부부는 자식을 두지 못했다.
단명하고 손이 귀한 집안에서 강건하지 못한 나는 잊을 수 없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작은 통증에 민감하고, 별일 아닌 증세에 고민하며, 반복되는 증상에 쉽게 지친다. 몸을 쓰는 일은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과도하다 싶으면 운동도 머뭇거리게 된다.

의학 지식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련하게 희미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첫사랑을 닮았다. 잊혀진 듯 하다가도 계기 없이 불쑥 나타나기도 하며,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다시 고민하게 하고, 뻔히 알고 예정된 결과지만 한사코 감추고 잊고 싶은 마음, 그것이다. 하지만 끝이 있어 아름답고, 마지막이 오기 때문에 시작과 과정이 고귀하다. 그렇듯 죽음과 질병은 물리치거나 잊어야할 폐기물이 아니라 삶과 함께 하는 필수품이리라. 오늘도 죽음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느긋하게 유영한다.
▲ 사진출처: www.pennlive.com\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