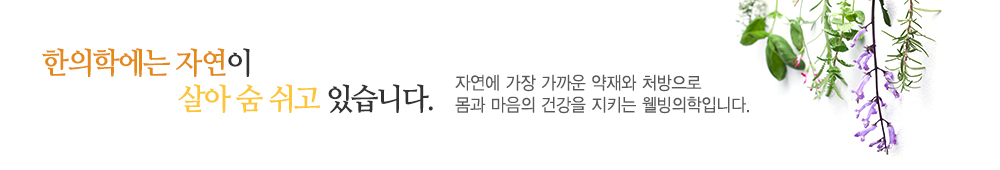|
파란 하늘에 붉은 단풍이 곱다. 흐르는 시간은 쉼이 없고, 드리운 공간엔 틈이 없다. 가만히 멈춰 있는 바람이 없듯, 텅 빈 땅은 찾을 수 없다. 하늘은 변화하고, 땅은 꽉 차 있다. 그 위에서 변화가 계절을 타고 온다.
자연처럼 사람에게도 계절이 있다. 하루로 치면 새벽 5시에서 아침 11시까지 봄, 오후 5시까지 여름, 저녁 11시까지 가을, 잠자는 동안이 겨울이다. 일생을 보면 사춘기까지는 봄이고, 자식을 낳을 때까지가 여름이며,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을, 그다음 은퇴 후가 겨울이라 할 수 있다.
솟구치는 봄이나 타오르는 여름에는 옆도 보이지 않고 뒤돌아본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 과감하게 위로 앞으로 돌진이다. 이런 추진력이 몸과 마음을 키운다. 이 힘이 누워만 있던 갓난아기가 고개를 들고 몸을 뒤집으며 일어서게 한다. 이 힘이 키를 키우고 몸집을 불린다. 멋모르고 사랑하게 하고 부모를 떠나 독립하도록 부추긴다. 이러한 생명의 활력이 세상을 활화산처럼 꿈틀거리고,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게 한다.
가을에 접어들면 벼나 과일처럼 사람 또한 안으로 영글어 간다. 영그는 것이 단단한 껍질을 가지듯 사람도 영글면 배타적이 되는 건 아닐까? 이 껍질이 숨 쉬는 옹기가 아니라 꽉 막힌 압력밭솥 같다면, 다른 의미와 서툰 몸짓을 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열매 맺음은 위로 오르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진 것을 지키거나 이룬 것에 안주하는 것은 아닐까? 뜨거운 여름에는 ‘이것 아니면 그 무엇도 아닌 것’이 이제는 ‘이것이 완전하지 않듯 저것 또한 그 무엇이겠거니’ 여기며 제법 느려진다. 이는 분출하였던 생명력이 아래로 사그라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가을이라고 봄과 여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가을날 하루 중에 새벽과 아침이라는 봄여름 기운이 있다. 아직 여름이 다 가지 않아 더운 것이 아니다. 가을에도 여름 같은 한낮이 반드시 있다. 가을 같은 나이라도 여름 같은 변화의 생명력이 숨어있다. 틀에 박힌 지금을 박살 낼 봄을 찾아야 한다. 태양이 땅 밑에 숨어 떠오르는 새벽과 보란 듯이 내리쬐는 한낮이 없는 그런 가을은 없다. 세상의 도리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반기를 들고 앞으로 돌진하는 힘을 가진 자는 언제나 푸르른 청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