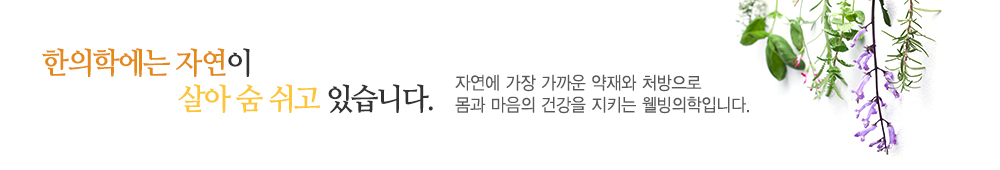|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수명’은 이를 표시한다. 어떤 해의 출생자가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 기대하는 수명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1984년 67.8세에서 2013년에는 81.9세로 14세나 증가하였다. 그런데 병에 걸린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하게 사는 동안의 나이인 ‘건강수명’은 2012년 66세로 기대수명보다 15년 정도 짧다. 살아있는 동안 15년은 아플 거라 짐작하고 산다는 것이다.
1984년 한국인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54달러였다. 2014년에는 2만 8,180달러로서, 30년간 10배 이상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건강지수는 30년 전인 1980년대보다 10배 이상 더 좋아졌을까? 아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자료에서는, 대부분의 OECD 국민 60% 이상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인은 30%에 머물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전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벌어들이고, 10년 이상 더 오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은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 노팅엄대 교수인 리처드 윌킨슨이 지은 [평등해야 건강하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개인의 건강 또한 더욱 나빠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에서 더욱 건강하게 산다’는 상식을 깨뜨리는 얘기다. 사회의 건강 수준은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소득 격차에 달려 있음을 윌킨슨 교수는 강조한다. 즉 소득이 30년간 10배 이상 급증했지만, 소득 격차의 엄청난 증가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이에 따라 자신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불평등이 심한 미국은 GDP 수준이 미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리스보다 평균 기대수명이 더 낮고 세계 25위에 불과하다. 심지어 미국의 극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높다. 미국 50개 주와 캐나다 10개 주를 대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살인율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상대적 소득 격차가 커짐에 따라 살인율은 무려 10배나 높아졌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국가의 국민소득이 아니라 국민 간 소득 격차가 건강에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몸을 부대끼는 지역 공동체의 평등한 결속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 지역 공동체의 결속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에게 과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될 때 굳건해진다. 이런 사회는 평등하며 건강 수준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