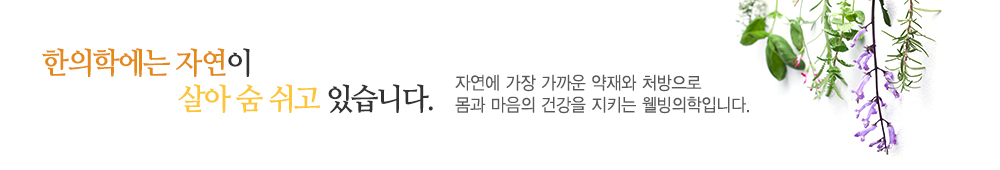지금도 끝나지 않은 메르스 사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 따라서 사태의 결과는 천양지차였다.
중국의 호들갑스런 대응이나 미국의 일사불란한 대처를 보면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평가하기가 쉬워졌다.
그 나라들은 메르스가 침입하지도 못했고, 침입하자마자 처리되어 버렸다.
한국은 온 나라가 난리가 난 듯 두려움에 떨었다.
전염병만 그런 것 아니냐고? 아니다.
대다수 병의 원인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도 국가에 따라 많이 다르다.
가장 흔히 걸리는 병인 감기만 보아도 국가 간 차이는 예상외로 크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먹인다.
오래가거나 심하면 입원을 불사한다.
영국 등 공공의료가 중심인 나라에서는 쉽게 처방하지 않는 약을
우리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꼬박꼬박 잘 먹인다.
여러 질병의 발생과 치료법이 서로 다른 이유 중에
의사나 부모 개인의 생각을 넘어선 국가의 의료체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루 한 시간이라도 빨리 나아야만 할,
길고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사회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감기뿐만이 아니다. 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등에 대한
치료 방법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주의력결핍장애 등 새로운 질병은 더욱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흔하게 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불규칙한 식사, 충분치 않은 휴식, 잦은 음주와 흡연 등은 개인만의 문제일까?
이러한 원인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어느 하나도 개인의 범주를 벗어나서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의 조건과 떼려야 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생활을 관리함과 함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국가와 보건의료체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헌법 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다.
독일이나 영국 등에서는 환자에게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등 무료 진료 혜택을 주고 있다.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인 만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 |
 |
|
| ▲ 사진출처 www.pharmacist.or.kr |
외국의 경우 공공의료가 90%, 민간시설이 10%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민간의료가 주축이고 공공의료가 이를 보완하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에는 국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자기 질병은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사회통념이 깔려있다.
이는 한국은 약육강식의 야만사회라는 의미이다.
건강하고싶다면 한국을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