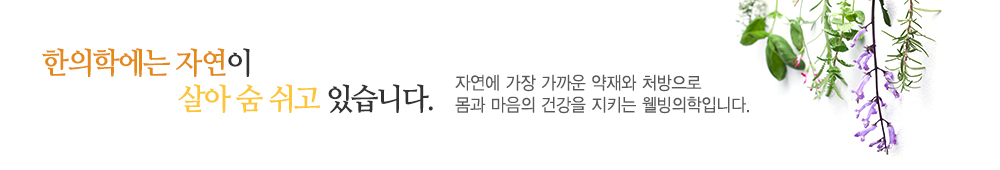|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여씨춘추]라는 옛날 책에 이런 글이 있다. “무릇 사람은 삼백육십 개의 마디와 아홉 개의 구멍과 오장과 육부가 있다. 피부는 조밀하기를 바라고, 혈맥은 통하기를 바라며, 정기는 운행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 병이 머물 곳이 없고, 추한 것이 생겨날 근거가 없게 된다. 병이 머물고 추한 것이 생겨나는 것은 정기가 막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이 막히면 더러워지고 나무가 막히면 굼벵이가 생긴다. 나라도 막히는 것이 있다. 군주의 덕이 베풀어지지 않고 백성이 바라는 바가 펼쳐지지 않는 것이 나라가 막히는 것이다. 나라가 막힌 채 오래 지속되면 온갖 추한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모든 재앙이 무더기로 발생한다.”
우리가 병을 치료한다고 할 때의 ‘치(治)’는 물수변이 있듯, 본래 물길을 다스린다는 ‘치수’라는 말에서 왔다고 한다. 물은 자고로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위와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막히면 고이고, 고이면 썩는다. 무릇 생명에는 흐름이 있고, 이 흐름에 변화가 생겨 순조롭지 못할 때가 병이 나는 것이고, 이 흐름이 막혀 완전히 멈추었을 때가 죽는 것이다.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則不痛, 不通則痛)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다. 이 세상에서 생명체는 결단코 통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조차 없다. 동물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찌꺼기를 배설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다. 식물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 통해야 할 흐름이 막히면 병이 난다. 한의학에서는 정기가 막히는 기울증으로 부종에서부터 우울증까지 생기며, 체액이 막히는 담음증으로 가래에서부터 온갖 통증이 생기고, 혈액이 막히는 어혈증으로 멍드는 것에서 불임 등까지 여러 병이 생긴다고 본다.
이들 병의 치료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 통하게 하는 것이다. 통하게 하면 병이 없다. 통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다. 이 흐름은 움직이는 것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지름길이다.
현대인들은 움직임이 점점 없어지는 생활과 노동으로 담음이 매우 많다. 체액이 뭉친 담음을 흐르게 하는 음식 중에서는 생강과 모과가 좋다. 생강차와 모과차를 자주 드시라. 이때 주의할 점은 설탕을 넣지 않는 것이다. 설탕은 몸 안의 체액을 정체시킨다. 설탕에 재어놓은 모과차는 입에는 좋을지 몰라도 몸에는 전혀 좋지 않다.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은 의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통용된다. 꽉 막혀 답답한 세상이다. 막힘이 다하면 뚫리는 것 또한 반듯한 이치이니 가만히 있지 말고 마음 편히 움직이자. 움직임이 곧 생명이다.
|